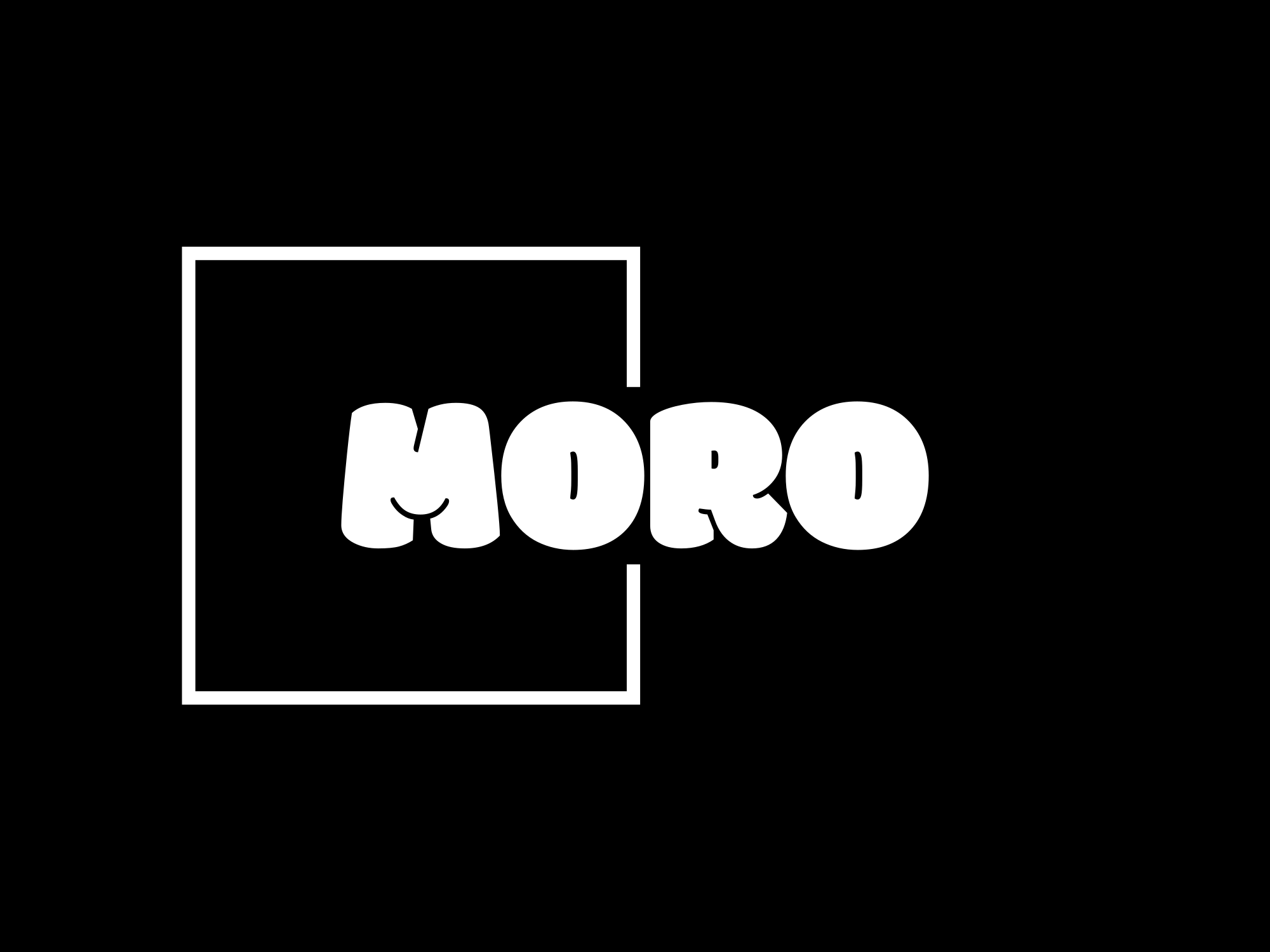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면: 군사반란의 그날"
1. 시대적 배경: 민주화 요구와 정치적 불안의 시기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통치에 대한 불만과 민주화 요구의 목소리로 가득 찬 시기였다. 정치적인 불안이 높아지면서 민주화 운동과 학생 시위가 전국에 퍼져나갔다.
2. 박정희 정권의 안보 정책: 군사 강화와 독재, 사망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를 강조하며 국가를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1972년에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군사정권을 강화하고, 1974년에는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는 '유예연장법'을 통과시켜 연임을 계속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독재적인 통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민주화 운동과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부터 국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부산지역에서 격화되자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가 확산된 마산 창원 지역에는 10월 20일 위수령을 발송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총살되자 이튿날인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부에게 군사력을 동원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더 큰 반발과 민주화 운동을 촉발하게 되었으며, 이어지는 군사반란과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3. 12.12 서울의밤 : 군부독재의 시작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뒤 최규하 과도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로써 정승화는 군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보하고 자신이 정치 일정을 이끌어 가는 데 핵심역할을 담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4년제 육군사관학교 최초의 기수인 11기의 지도 아래 하나의 배타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하면서 군부 내 세력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격으로 10·26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세력(신군부)이 기존의 육군지도부였던 정승화 세력과 갈등하게 되었던 것이다. 갈등을 일으키게 한 대립의 쟁점은 사건수사와 군의 인사문제였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金載圭)의 내란에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10·26사태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10·26사태 당시 정승화는 궁정동 안가의 대통령 시해현장 부근에 대기하였으며 사건 이후 김재규를 구속할 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전두환 합수부장의 지시에 따라 12일 저녁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 병력 65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 뒤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로 연행하였다.
윤성민 육군참모차장 지휘하의 육군 수뇌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군에 비상을 발동하고 합동수사본부 측에 정승화의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미 11 공수여단과 55 공수여단 병력이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였으며 9사단 병력 등은 중앙청으로 진입하였던 것이다. 이에 진압군 병력 출동을 추진하였던 육군수뇌부(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李建榮 3군사령관, 윤석민 참모차장, 文洪球 합참본부장)는 모두 서빙고 분실로 불법 연행되었다.
이와 같은 반란군의 정승화 연행과 병력이동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졌다.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군부세력은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하여 총장연행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전두환 합수부장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가 김재규와 연루된 새로운 사실(돈을 받는 등)을 발견하였으니 정승화를 연행 조사토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승화는 후일 김재규에게 받은 돈 300만 원은 단순한 추석 촌지로서 당시 전두환도 500만 원 수령 사실을 인정했었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데 실패한 신군부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하여 그를 통하여 대통령이 총장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하였다.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할 수밖에 없었다. 13일 오전 9시 9사단장 노태우와 50사단장 정호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당시의 군부가 반란의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4. 정치적 분열과 불안의 씨앗
군사반란은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들 간에 강한 비판을 일으켰다. 정치적 분열과 불안은 국내 정세를 악화시켜, 이 사건 이후의 정치적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치적인 갈등은 국가를 향한 단합된 노력을 방해하였고, 이는 향후 정치적인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5.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은 12.12 군사반란
12.12 군사반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불안과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 그날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며, 민주주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테슬라, 노조 결성 시도 직원 '보복 해고' 혐의 기각 (0) | 2023.11.29 |
|---|---|
| 공영방송 KBS, 이제는 YBS 아닌가? 윤석열을 위한 방송국 (0) | 2023.11.29 |
|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가나? (0) | 2023.09.16 |
| 고공행진 중인 휘발유, 대체 어디까지 오르려나? (0) | 2023.09.16 |
| 어디서 시작 되었니? - 세계 스카우트 연합 (0) | 2023.08.07 |

